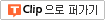1900년대 초반부터 시작된 일제하 기독교 선교사들의 한센병 구료 사업을 바라보는 일반적 시각은 기독교계 한센병 요양시설이 식민지 권력과 경쟁, 협조, 배제라는 복잡한 역학 관계 속에 있었다는 다의적 평가가 많았던 게 사실이다. 식민지 한센병 통제의 부정적 유산을 공유했다고 파악한 것이다. 다시 말해 여수 애양원을 비롯한 선교사 운영 시설들이 한센병 환자를 격리의 형태로 차별했으며, 이 점은 소록도 갱생원을 중심으로 펼쳐진 일본제국주의의 파시즘적 한센병 환자 대책과 유사하다는 평가였다.
지난 9일 한국기독교역사학회가 주최한 제280회 학술발표회는 이러한 비판적 시각과는 달리 애양원과 선교사들의 활동은 순수한 의료 선교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는 주장을 펼쳤다.
공주교대 최병택 교수는 “기독교계 한센병 요양소에서 환자들은 물리적 폭력과 배제의 형태로 구현되었다기보다는 그 반대의 모습으로 구체화되었다”며 “선교사들은 환자들을 죄로 인해 병을 얻게 된 자로 여기기보다 병을 통해 복음을 접하게 된 선택된 자로 여기는 경향을 보였다”고 분석했다.
이러한 인식에 기반해 선교사들은 한센병 환자들을 일정한 장소에 수용해 치료와 전도의 대상으로 삼고 한센병 의료선교 사역을 전개했다는 것이다.
최 교수에 따르면 애양원의 환자 수용 방침은 외적으로는 격리의 형태를 취한 것으로 보이지만 내부 질서를 유지하는 방법과 환자의 퇴원 허용 여부 등은 소록도 갱생원의 ‘절대적 격리주의’와는 달랐다는 점이다.
절대 격리주의는 일종의 종신 무퇴원주의로 퇴원 없이 환자를 엄격히 격리해 직접적으로 일상생활을 간섭, 통제하던 방식이었다. 이 때문에 환자들에 대한 인권 유린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애양원은 그러나 ‘치유 퇴원주의’를 채택해 환자의 자발적 퇴원과 일시 귀가, 외출을 허용했다. 또 환자들의 일상생활에 간섭하지 않고 교회를 통한 간접 개입 방식을 취했다. 자치를 인정한 것도 차별화된 방침이었다. 이러한 운영은 환자들이 퇴원 후 격심한 사회적 편견 속에서 살아갈 방도가 없어 대부분 환자들이 애양원에 남기를 원했던 것과 무관하지 않다.
애양원의 경우 안정성을 지속할 수 있었던 또 다른 이유는 애양원교회 2대 목회자로 부임한 손양원 목사 때문이기도 하다. 애양원교회는 광주나병원이 설립된 1909년 만들어졌다. 출범 당시 교회는 나병원이 자리 잡은 지역 이름을 따 ‘봉선리교회’로 불렸다. 교회는 한센병 환자들의 신앙을 지도하는 역할을 맡아 매일 새벽과 정오에 기도회를 열고 저녁에는 성경공부를 실시하는 등 하루 종일 환자들을 위한 일정을 관리했다.
손 목사는 애양원을 제임스 켈리 웅거(James Kelly Unger) 목사의 추천으로 맡게 됐다. 동양선교회의 전도를 받아 성결교회를 다닌 경력으로 손 목사의 신앙관은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을 특징으로 하는 보수적 면모가 뚜렷했다.
하지만 그는 1대 목회자였던 김응규 목사와는 달리 환자들의 처소를 자유롭게 드나들었고 식사를 같이 하는 등 감염을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한다”는 평을 듣기도 했다.
손 목사의 이러한 활동은 애양원 환자들이 지속적으로 신앙생활에 매달리도록 독려했고 환자들은 애양원에 속해 있는 한 신앙적으로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완전 치유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질 수 있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환자 대부분이 수용자 입장에서 신앙을 피동적으로 받아들인 경우가 많았다는 점은 간과될 수 없다. 최 교수는 “과거 의료선교를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현재 진행된 기독교 선교의 문제점을 짚어보는 데 시사점을 던지고 있다”고 말했다.
신상목 기자 smshin@kmib.co.kr